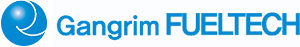새가 둥지를 치듯 먹으로 그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ns339 조회8회 작성일 25-08-01 21:42본문
동두천치과
새가 둥지를 치듯 먹으로 그은 선이 화면 위에 얽히고설켜 있다. 분명 먹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수묵의 농담은 찾아볼 수 없고, 선명하게 대비된 흑과 백이 조화를 이룰 뿐이다.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우관중(1919~2010)이 생애 마지막에 남긴 작품인 '둥지'(2010년)다. 평생 수묵화와 서양화를 오가며 새로운 회화를 창조하고자 했던 그는 가족의 만류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그 화폭에 드러난 점, 선, 면은 미술을 향한 그의 격렬했던 투쟁과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의 섬세한 감정을 동시에 상기시킨다.우관중의 국내 첫 개인전 '우관중: 흑과 백 사이'가 오는 10월 19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여가문화서비스부가 기획하고, 예술의전당과 홍콩예술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홍콩예술박물관이 소장한 회화 대표작 17점을 선보인다. 홍콩예술박물관은 우관중의 아들 우커위가 미술관 측에 1억홍콩달러(약 177억원)를 기부하면서 진행하게 된 우관중 해외 순회전의 첫 행선지로 아시아의 새로운 미술 거점으로 떠오른 서울을 택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우관중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20세기 현대미술가 중 한 명이다. 중국 장쑤성 이싱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 항저우의 국립중국미술학원(CAA)에 입학해 린펑몐(1900~1991), 판톈서우(1897~1971) 등 거장들에게 사사했다. 1947년에는 국비장학금을 받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고, 그 영향으로 유화를 통해 중국 전통 수묵화와 현대 서양미술을 통합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조형언어를 구축했다. 1950년 중국으로 돌아와서는 중앙미술학원, 칭화대, 베이징미술학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열의를 쏟았다. 우관중 '수로'(1997). 홍콩예술박물관 역사적으로 전통을 중요시하는 중국에서는 산수화·화조화·문인화 등 옛 회화와 서예, 도자기 등 오랜 기간 고미술이 각광을 받아왔다. 중국의 현대미술조차 전통에 부합하는 작품이 주목을 받았을 정도다. 우관중은 이런 틀을 깨고 일찍이 중국에서 서양미술을 받아들여 이를 동양적으로 재해석한 추상회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우관중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중국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DMZ 전경.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리얼 베이비돌’ 인형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아기처럼 정교하게 제작된 인형을 통해 불안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얻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형을 통해 외로움과 상실을 치유받는 이들에게 감정과 존재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위로와 치유의 과정을 보며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질문해 본다.인간은 문명을 창조했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켰다. 자연을 정복하고, 기술 발전을 통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와 노동을 대신하는 지금,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있을까.지난 6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DMZ 평화생명동산을 찾았다. 16년째 현장을 가꾸고 있는 정성헌 이사장은 “이곳은 인간이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삶터입니다. 인간은 그저 머물며 치유와 희망을 얻을 뿐이지요.”라고 말했다.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과 흙냄새까지 살아 숨 쉬는 동산. 그곳은 단순한 교육장이 아닌 생명과 평화의 성소였다. 자연은 쉼 없이 자신을 회복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진정한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DMZ평화생명동산 전경. 사진=조금평 개발이 멈춘 DMZ 생태보존지구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이 자생하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공간에서 자연은 본래의 질서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비인간 존재’의 강력한 메시지로, 자연을 지키는 일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인류의 생존 조건이자 평화의 출발임을 각인시켰다.도시화와 산업화는 우리 삶을 급격히 바꾸었다. 도시는 과밀과 고립에 시달리고, 농촌은 감소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기술과 효율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연과 단절되었고, 단절은 고립과 상실을 넘어 불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우리는 그동안 깨끗한 물, 건강한 흙, 맑은 공기의 가치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했고,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홍수, 가뭄과 산불의 빈번한 자연재해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되묻게 한다. 자연은 더 이상 무한정 제공되는 대상이 아니며
동두천치과